Premium Only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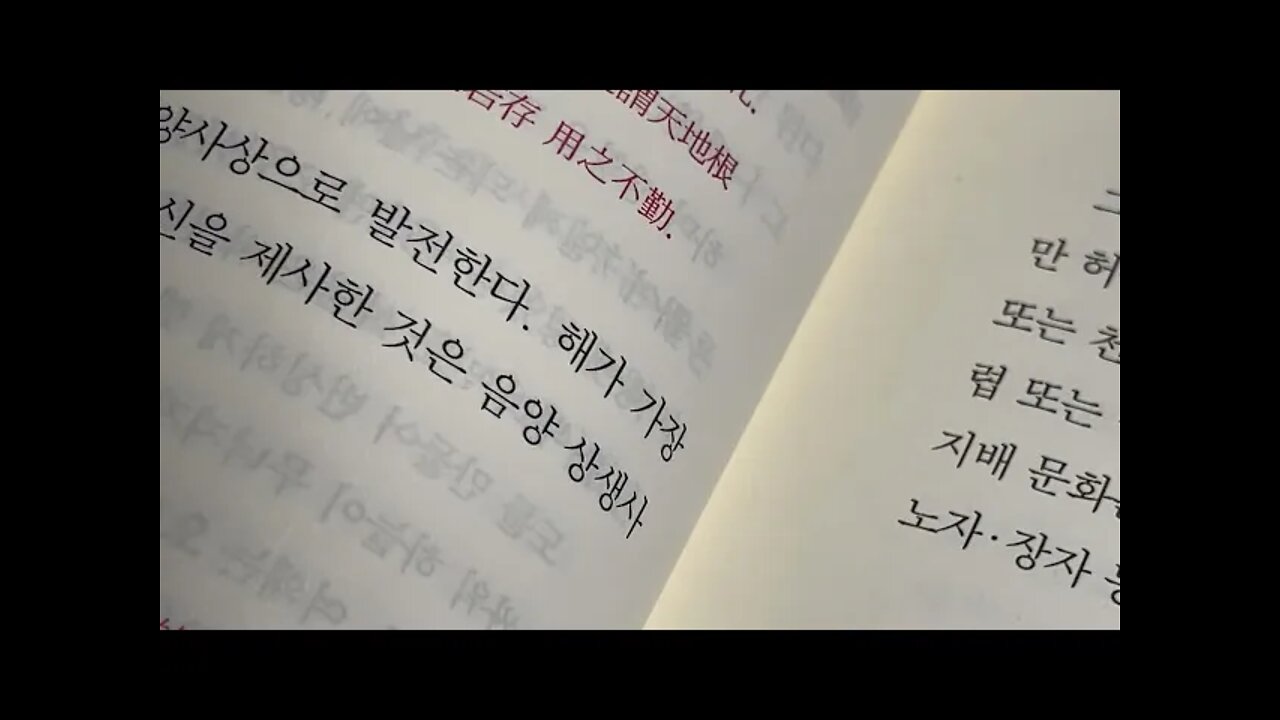
묵자, 묵점 기세춘, 중국의 지신, 여왜, 춘추번로, 순명, 굴원, 회남자, 남명훈, 곽박, 산해경, 대황서경, 노자, 암컷숭상, 곡신, 시경, 남방의신, 돌덧널무덤, 예기,제법
1장 묵자는 누구인가?
출신 성분 / 묵자의 사상적 위상
묵자는 혁명가 / 묵가는 협객 집단
2장 보수와 진보의 쌍벽
천하가 공묵에 기울다 / 묵가들의 유가 비판
공자의 인애는 신분차별적이다
3장 종교사상
동양의 하느님 / 서양의 신 / 동양의 유물론
묵자의 하느님과 예수님
4장 철학사상
존재론 / 시간의 철학 / 인식론 / 인성론 / 가치론
5장 논리학
명실론 / 묵자의 논리학 / 묵자의 논리학과 삼단논법
묵자의 명실론과 논리실증주의
6장 정치사상
민주적 정치론
7장 공동체론
대동사회 / 소강사회 / 서양의 공동체론
공동체의 조건과 인류의 회심
8장 경제사상
묵자는 경제학의 시조 / 묵자는 진보주의 시조
9장 사회ㆍ문화사상
묵자의 노동 해방 사상 / 초과 소비론
호사스런 음악과 장례 반대
10장 반전 평화론
전쟁은 무엇인가? / 묵자의 반전 평화 운동
[원전읽기]
제1편 친사
제2편 수신
제3편 소염
제4편 법의
제5편 칠환
제6편 사과
제7편 삼변
제8편 상현 상
제9편 상현 중
제10편 상현 하
제11편 상동 상
제12편 상동 중
제13편 상동 하
제14편 겸애 상
제15편 겸애 중
제16편 겸애 하
제17편 비공 상
제18편 비공 중
제19편 비공 하
제20편 절용 상
제21편 절용 중
제22편 절용 하
제23편 절장 상
제24편 절장 중
제25편 절장 하
제26편 천지 상
제27편 천지 중
제28편 천지 하
제29편 명귀 상
제30편 명귀 중
제31편 명귀 하
제32편 비악 상
제33편 비악 중
제34편 비악 하
제35편 비명 상
제36편 비명 중
제37편 비명 하
제38편 비유 상
제39편 비유 하
제40ㆍ42편 경ㆍ경설 상
제41ㆍ43편 경ㆍ경설 하
제44편 대취
제45편 소취
제46편 경주
제47편 귀의
제48편 공맹
제49편 노문
제50편 공수
제51편 □□
제52편 비성문
제53편 비고림
제54편 □□
제55편 □□
제56편 비제
제57편 □□
제58편 비수
제59편 □□
제60편 □□
제61편 비돌
제62편 비혈
제63편 비이부
제64편 □□
제65편 □□
제66편 □□
제67편 □□
제68편 영적사
제69편 기치
제70편 호령
제71편 잡수
[찾아보기]
주요 용어 및 인명 찾아보기
원문 출전 찾아보기
책 속으로
묵자는 초나라와 월나라 등 여러 곳에서 봉토를 주겠다고 하며 초빙을 받았으나 귀족의 신분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노동자의 검은 옷을 입고 전쟁 반대 운동에 목숨을 걸었으며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 p.32
묵자는 철학자이며, 과학자요, 경제학자요, 반전 평화운동가였으나 그보다 혁명가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그는 실천하고 조직하고 투쟁한 사회혁명가였다. 그는 “내 말은 반석과 같으니 깨뜨릴 수 없다”고 외치며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 p.42
묵자는 평등한 사랑을 주장하고, 공자의 인仁을 체애體愛, 즉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비판한다. 겸兼이란 아우름과 평등을 의미하며, 그 반대는 개별의 체體와 차별의 별別이다. 공자의 인은 개인의 혈연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묵자의 겸애는 혈연적 신분 관계를 초월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 각자의 주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 p.78
묵자의 하느님은 인격신이란 점에서는 기독교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그리스적인 영향을 받아 육체를 가진 신이었으나 묵자의 신은 육신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묵자의 하느님의 인격은 섭리에 가깝다. 그래서 묵자는 역사의 주체는 신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은 민중과 별도의 인격을 갖지 않고 민중의 뜻이 바로 하느님의 인격이었다.
--- p.143
플라톤보다 앞서 묵자는 ‘공간의 운동이 곧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변화이며 이동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즉 플라톤은 공간의 운동만 생각했지 묵자의 우주의 변화와 이동을 간과하고 담아내지 못했다. 특히 현재를 타파하려는 혁명적인 묵자에게 변화와 이동은 불가피한 요청이었다.
--- p.202
묵자는 평등론의 근원을 하늘의 뜻(天志)에 두는 천부인권론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의 평등론은 신분, 빈부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 기회의 평등이다. 즉 그는 인권의 평등, 이른바 ‘자유의 평등’을 주장한 것이지 ‘소득의 평등’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 p.260
묵자의 공동체운동은 생명 존중인 ‘애愛’와 공동체 정신인 ‘겸兼’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특징이다. 묵자는 자신의 사상을 ‘천하에 남이란 없다(天下無人)’는 한 마디로 요약한다. 이 말은 온 세계와 인류가 서로 남이 아니고 한 가족이라는 뜻이다. 특히 그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직하여 몸소 노동을 했으며, 생명 죽임의 전쟁을 생명 살림 공동체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평생 동안 전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 p.307
묵자의 절용론은 금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모욕을 참아야 한다거나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동사회 즉 안락하고 풍요로운 ‘안생생’ 사회의 건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의롭다고 찬양했다. 그러므로 그의 소비론은 인민의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초과 노동으로 수고롭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 p.328
묵자의 반전운동은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받는 나라를 방어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전쟁을 문화 · 사회적으로 관찰했으므로 전쟁을 없애기 위해 의식 개혁 운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세했다. 그는 놀랍게도 전쟁으로 인한 재화의 낭비와 노동 손실을 지적하고, 전쟁 비용으로 적국에게 경제 원조를 해서 적국의 인민을 도와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평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 p.370 닫기
출판사 서평
왜 묵자인가?
-2천 년 동안 금서였던 『묵자』!
묵자墨子는 춘추전국시대 공자孔子와 더불어 공묵孔墨이라 일컬어질 만큼 제자백가의 거두였다. 『회남자淮南子』에는 “공자와 묵자의 명성은 영토가 없었지만 천자의 지위를 누렸고 천하를 두루 유묵儒墨에 기울게 했으며, 묵자를 따르는 무리는 백팔십 인인데 불 섶을 짊어지고 칼날을 밟으며 죽어도 돌아서지 않았다”고 전한다. 또 『맹자孟子』에서는 “양자楊子와 묵자의 말이 가득하여 천하의 언론은 양자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자로 돌아간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천하에 가득하던 묵가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이에 대해서는 한漢 무제武帝 때인 BC 136년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로 백가를 폐출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자 권력의 탄압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신빙성 있다. 이후 『묵자墨子』는 유가와 법가의 책에서 단편적으로 거론될 뿐 자취를 감추었다가 17세기 초 도가의 경전 속에서 발견되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18세기가 되어서야 최초의 주해서가 나온다. 『묵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도 20세기 중엽의 일이다. 인류사에 이처럼 2천년이 넘도록 금서였던 책은 아마 『묵자』가 유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나 맹자孟子는 알지만 묵자는 생소하게 느낀다. 묵자의 이름은 알지만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는 것도 유가적 시각에 구애된 중국학자들의 교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묵자 사상을 모르는 한문학자들의 오역이 더해진 번역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 많다. 실제로 유가 같기도 하고 도가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사상으로, 또 겸애설 한 마디만으로 묵자를 아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묵자의 사상은 유가나 도가와는 다른 독창적인 사상이다. 『묵자』에는 유가들의 예악을 비판하는 글이 곳곳에 등장하며, 「비악非樂」 · 「비유非儒」 등 안티테제의 글이 독립된 편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또 묵자는 인민들과 더불어 산 노동자였으므로 세상에 회의와 염증을 느껴 속세의 문화와 제도를 거부한 노자?장자와도 다르다.
묵자는 반전 평화운동과 절용 문화운동을 전개한 사회운동가이자 혁명가였으며, 인류 최초로 우주宇宙와 공간과 시간을 말한 철학자요, 정교한 가격이론을 제시한 경제학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신분 계급과 노예제가 엄연히 존재하던 고대 사회에 천하 만민에게 두루 평등한 사랑을 외친 평등주의자요, 박애주의자였다. 이처럼 묵자는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사상가였으며 그의 사상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어떠한가? 지구촌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다. 민간인 희생도 불사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자살 폭탄테러로 맞선다. 텔레비전을 통해 우주인의 생활이 실시간 중계되는 시대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간다. 이것이 예수와 공자와 부처 또는 다른 신이나 이성을 믿는 우리의 이면인 것이다.
종교는 갈 곳을 잃었고, 풍요와 번영을 약속했던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약자의 고통을 양산했으며,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꽃이라 했던 월스트리트로부터 시작된 진동은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 지구는 파멸되어 간다. 이제 인류는 회심해야 한다. 인류의 종말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러나 우리는 혼돈에 빠져 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묵자의 사랑인지도 모르겠다. “천하 만민을 모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묵자의 말은 귀감이 된다. 이기주의로 점철된 현대사회에 대한 처방은 오직 이것뿐일 것이다.
묵자는 말했다.
“너에게 천하를 주겠으니 그 대신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하가 아무리 귀하다 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 한 마디로 서로 죽이기도 한다. 이는 의義가 목숨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사는 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하니 그 의라는 것이 혼란되어 있다.”
-
 43:13
43:13
BonginoReport
3 hours agoSuper Bowl Vibe Shift: Trump Cheered, Taylor Swift Booed (Ep.136) - 02/10/2025
29K68 -
 LIVE
LIVE
Wendy Bell Radio
5 hours agoThe Rats Are Scrambling
15,056 watching -
 LIVE
LIVE
Jeff Ahern
1 hour agoMonday Madness with Jeff Ahern (put a fork in them)
522 watching -
 42:43
42:43
Dad Dojo Podcast
8 hours ago $0.35 earnedEP19: Cashing In Crypto
5.61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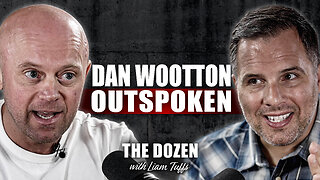 2:30:07
2:30:07
TheDozenPodcast
21 hours agoEpstein island, fake news, Royal Family scandal: Dan Wootton
3.63K4 -
![RASKIN THREATENS CLASS ACTION TO STOP MUSK. BERNIE LIES TO THE PUBLIC ABOUT DOGE [EP 4434-8AM]](https://1a-1791.com/video/fwe1/5e/s8/1/_/a/t/I/_atIx.0kob-small-RASKIN-THREATENS-CLASS-ACTI.jpg) LIVE
LIVE
The Pete Santilli Show
4 hours agoRASKIN THREATENS CLASS ACTION TO STOP MUSK. BERNIE LIES TO THE PUBLIC ABOUT DOGE [EP 4434-8AM]
1,321 watching -
 10:31
10:31
Space Ice
23 hours agoHardcore Henry - A Average Day In The Life Of Space Ice - Best Movie Ever
5.28K22 -
 8:03
8:03
Colion Noir
22 hours agoA Judge Just Ruled You Can Own A Machine Gun
14.5K55 -
 46:13
46:13
Survive History
22 hours ago $0.49 earnedCould You Survive in the Roman Special Forces?
8.28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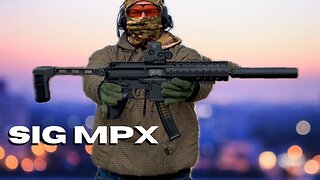 19:40
19:40
Fit'n Fire
23 hours ago $0.02 earnedThe Best PDW -- Sig Sauer MPX 8" PDW
4.34K4